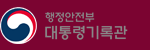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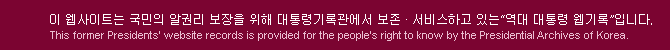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이 골프 모임 이후 나와 김종필 총재는 '불신과 우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민주 공화 양당의 합당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와 김종필 씨는 그때까지 서로 당을 달리했지만 오랜 인연이 있었다. 1963년 민정 이양을 앞두고 김종필 씨가 구 공화당을 사전 조직했을 때, 야당 정치인이던 나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거절했다. 1983년 정치암흑기에 내가 23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만들면서 김종필 씨에게 함께 전두환 정권과 싸우자고 권유했는데, 그는 나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 가 버렸다.
1987년 12.16 대선 과정에서는 김종필 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나를 지지하기로 한다는 막후 대화가 깊숙이 진전되었는데 막바지에 틀어져버린 사연도 있었다. 나는 선거 과정에서 '유신 잔당'이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은 김종필 총재가 '나는 유신 본당'이라고 대응한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따지고 보면 김종필 씨도 그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당시 제1 야당의 원내총무를 지냈던 나와 '포스트 박'을 겨냥했던 김종필 씨의 이해관계는 적어도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았다. 또 유신체제하에서 그는 겉모양과는 달리 견제와 소외를 당했다. 그런 그가 끝내 유신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인의 자세로선 평가할만한 것이다.
나는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며 또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와는 정치를 떠나서도 친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나는 김종필 총재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 198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10주기 때 김종필 총재가 주관했던 추모식에 조화를 보냈다.